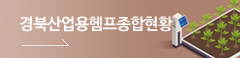해 뜨기 전 새벽 4시30분, 안개가 자욱한 산등성이로 둘러싸인 마을 입구에 들어섰다.
밭을 따라 3분 정도 걸었을까. 멀리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어슴푸레 들어온다.
가까이 다가가니 이미 밭 절반이 땅을 드러냈다. 아직 서 있는 줄기 사이로 부지런히 낫을 휘두르는 이들이 보인다.
사람 키보다 훨씬 큰 줄기의 밑단을 휘어잡고 낫을 휘두를 때마다 드르륵드르륵 소리가 난다.
이렇게 세 번 정도 휘두르면 농부의 왼손엔 베어진 줄기 수십 개로 가득 찼다.
밭 한쪽에 켜켜이 쌓인 잎과 줄기에선 퀴퀴하면서도 상큼한 냄새가 짙게 배어났다.
우리말로는 삼, 영어로는 헴프(Hemp)로 불리는 대마다.
2023년 6월23일 새벽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 있는 대마밭을 찾았다. 이날은 1년에 하루, 대마를 수확하는 날이다. 대마는 보통 3월 말에 심어 100여 일 동안 기른다. 다 자란 대마는 성인 키를 훌쩍 뛰어넘는다. 열대지방에선 6m까지도 자란다. 200평(약 661㎡) 정도 되는 밭 한쪽에서 임석호(65)씨가 자기 키보다 훨씬 큰 대마를 베고 있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도 그의 얼굴엔 땀이 줄줄 흘렀다.
“낫을 (줄기) 위에 대고 하면 안 돼. 훑을 때 줄기가 떨어져버려. 한번에 이래 해야 한다.” 그는 낫을 땅과 평행하게 밀착시켜 땅을 쓸어내리듯 줄기를 베어갔다. 임씨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곳에서 대마농사를 짓고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금소리에 사는 이들은 대부분 대마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지금 금소리에서 섬유용 대마를 기르는 농가는 세 곳 정도다. 임씨의 경우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와 계약해 전통문화 보존에 사용되는 대마를 재배한다.
“옛날 같으면 동네 집집마다 다 작업했어요. 할머니부터 전부 다 베 짜는 작업을 했고요. 한 1천 명 정도는 종사했는데 현재는 40분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대마 재배량이 줄어 수확량도 엄청 줄었어요.”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장 임방호씨가 말했다. 아침 6시가 되기 전에 대마 베는 작업이 끝났다. 베어놓은 대마를 집어 한 단씩 엮는 임석호씨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돌았다. “이 정도면 올해 농사 일등품이라.”
대마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널리 재배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에서도 안동은 삼의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질을 지닌데다, 뛰어난 직조 솜씨가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가장 좋은 품질의 삼베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다. 조선시대 궁중 진상품으로 쓰일 정도였다.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안동포짜기’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40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대마관리법 신설 이후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급격히 축소됐다. 이후에도 화장 문화 확산과 값싼 중국산 수의 수입 등으로 꾸준히 재배면적이 줄었다. 1960년대 안동에서만 재배면적이 5천여 농가 300헥타르였다면, 2022년 기준 전국 재배면적은 88헥타르 정도다. 그래서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는 일부 밭과 계약해 베 짜는 교육을 한다.
대마에는 칸나비디올(CBD)과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있는데, 흔히 마약으로 알고 있는 대마종엔 THC 함유량이 많다. 최근 국외에선 CBD 함유량이 높은 대마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안동은 2020년 국내 최초로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허가받은 기업이 이곳에서 의료용 대마를 재배하고 성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나 수출 등은 금지된다. 아직 규제나 기술 모두 걸음마를 막 뗀 수준이다.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 재배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재배할 수 있다. 허가만 받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농사지을 수 있다. 삼베를 만들 때 쓰는 줄기만을 수확하고 나머지는 탈곡기로 털어낸다. 섬유용 대마엔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인 THC가 거의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털어낸 잎은 모두 소각한다. 담당 공무원이 나와 소각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낫으로 베어내는 작업이 끝나자 일부 대마는 트럭에 실려 금소마을의 한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 소속 교육생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나무 막대기를 든 채 기다리고 있었다.
“노세 노세 베틀 노세. 천상에 옥황상제가 금소 땅에 내려와서 베틀 놓을 자리를 찾아보니 여기가 금당이로다. 베틀 노세 베틀 노세.”
한 교육생의 노래에 맞춰 교육생들이 저마다 대마 줄기를 쥐고 잎을 털어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전통 방식이다. 그렇게 한참 털어내니 마당에 대마 잎이 수북이 쌓였다.
이 과정까지 마친 대마가 향한 곳은 찜기다. 줄기째로 쪄서 햇빛에 말린 뒤 물에 불려 껍질을 벗긴다. 각각의 줄기를 잘게 찢어 길게 이은 뒤 온전한 실로 만들고, 그 실로 다시 베를 짠다. 흔히 수의에 쓰이는 삼베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모든 일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는데 그 노동 강도가 보통이 아니다. 오죽하면 ‘이골이 난다’는 말이 이 과정에서 나왔을까.
“삼과 삼을 연결하려면 끝이 가늘어야 해요. 그래서 입으로 물어뜯어요. 이렇게 평생 물어뜯으면 이에 골이 생겨요. 이 일이 그만큼 힘들어서, 힘들 때 ‘이골이 난다’고 한 거예요. 골이 생길 정도로 반복해서 지긋지긋하다는 뜻이죠.”(임방호 회장)
희미하게나마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으려는 노력은 보존을 넘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소마을에서 대마를 수확하는 날, 새벽부터 함께 나와 수확 과정을 지켜본 송나래(32) 작가도 영향을 받은 인물 중 하나다.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안동에 정착한 그는 섬유용 줄기를 채취하고 남은 대마 속대껍질과 석회, 물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반죽해 소가구와 오브제 등 예술작품을 만든다.
사실 대마는 오랫동안 섬유 외에 친환경 건축자재 등 다른 재료로도 활용됐다. 대마(헴프)와 콘크리트를 합성해 만든 ‘헴프크리트’가 대표적이다. 헴프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와 달리 독성이 없고 통기성이 좋다. 습도 조절과 단열에도 우수하다. 서울에서 주로 실크스크린 작업을 하며 화학약품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송 작가가 대마라는 재료로 작품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것도 이런 대마의 특징 때문이었다. “작업자와 환경에 모두 피해가 가지 않는 재료를 찾다가 대마를 알게 됐어요.”
대마를 이용한 송 작가 작품의 콘셉트는 ‘순환’이다. 그는 “화학재료를 쓰지 않고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재료만 사용해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순환을 지향한다”며 “지금은 작은 오브제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집을 짓는 작업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안동 병산서원에서 대마로 만든 작품을 전시한 그는, 2023년 8월엔 서울에서 이번에 수확한 대마 껍질을 활용해 만든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2023년 8월12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중구 ‘포스트 포에틱스’에서 열린다.